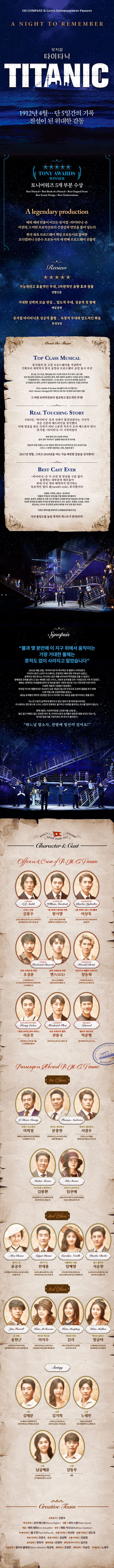뮤지컬 <타이타닉> 후기_2018 한국 초연


작품 개요
- 제목: 타이타닉
- 제작: 오디컴퍼니
- 작곡, 작사: 모리 예스턴
- 극본: 피터 스톤
- 연출: 에릭 셰퍼
- 안무: 매튜 가디너
- 무대 디자인: 폴 푸
- 의상 디자인: 조문수
- 음악감독: 변희석
- 관람시간: 150분 (인터미션: 20분)
- 초연: 1997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
※스포 있음
1997년 영화 타이타닉을 기반으로 만든 뮤지컬이 아니다. 이거 봐놓고 왜 '마이핥윌고온' 안 부르냐고 따지면 안 된다.


복잡한 다리와 복도를 구현한 듯한 무대 세트. 단 한번의 전환도 없이 모든 전개가 저 곳에서 이루어지는 고정물이다.
같이 본 사람들은 몹시 지루해했지만 나는 이 뮤지컬이 꽤 괜찮았다.
기억에 남은 넘버 하나도 딱히 없을 정도로 '모든 등장인물의 사연을 그리겠다'는 일념 하나에 충실한 듯한 전개였지만, 오디 감성 역시 충만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는 오디 감성을 좋아하긴 한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씬은 출항하기 전에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노래하는 장면.
저 배가, 저 배에 탄 모든 이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시작하는 극이다 보니 희망과 꿈에 부풀어 당대 최고의 기술로 건조한 배에서 부르는 이 밝은 오프닝 넘버가 어찌나 마음을 아리게 하던지.. 연인에게 '금방 돌아오겠다'고 노래하는 파트는 또 얼마나 경쾌해서 역설적이던지..
하지만 모든 러닝타임을 통틀어서 저게 제일 임팩트 있게 남을 줄은 몰랐지...세트 전환 없이 그려지는 작품이지만 바닥 뚜껑을 열고 빨간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걸로 지하 동력실을 표현한 것도, 소도구와 의상의 변화만으로 1등실 2등실 3등실로 자연스럽게 장소의 전환을 표현하는 것도 모두 좋았다.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고 ㅈㅔ천에서 큰 화재 사고가 있었다. 뉴스를 보고 있으려니 이 뮤지컬이 생각났다. 비상문 앞에 쌓아 놓았었다는 바구니들, 평소에도 열리다 말다 했었다는 자동문. 이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미리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고 작은 전조들을 흘려보냈을 때 갑자기 닥쳐온 사고는 많은 이들의 삶을 너무 이른 시점에서 앗아갔다.
실화에 기반한 뮤지컬 타이타닉에서도 그렇다. 보란 듯이 빨리 도착하겠다는 이유 하나로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속도. 권위는 안전보다 우선시되었고, 결국 충돌하고 침몰하는 배 안에서조차 권위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항상 사고가 생기고 난 뒤 사람들은 인재(人災)라며 산 사람 중에 누굴 처벌할지 각자의 목청을 높인다.
나라에 큰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그렇지만 '인재가 아닌 것이 있기는 한가' 싶을 정도로 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실수와 안이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으면서도 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된다.
그렇다고 나는 뭐 대단히 뭘 예비하고 대비하는 인간인가... 글쎄다...
인재다 인재다 하면서도 정작 개인이 뭘 그리 대비할 수 있는가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 집 소화기가 핀을 뽑으면 작동을 하기는 할는지 오랜만에 압력 게이지의 바늘이라도 한번 들여다보는 건, 오늘의 안녕이 내일도 모레도 늘 이렇게 일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집에 소화기 하나씩은 두세요.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어떤 학생이 속눈썹 올린다고 라이터로 뭐 달구다가 옆에 있는 화장솜에 불이 붙으니까 놀라서 불 끈다고 끼얹은 게 향수... 불난 데에 향수를 끼얹었으니 당연히 화재가 되었고 집을 싹 다 태웠다. 이게 텍스트로 기사로 접하면 '헐?' 싶겠지만 막상 눈앞에서 책상 위가 불타오르고 있으면 뭐라도 액체를 뿌리려는 손이 머리의 속도보다 먼저 튀어 나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거실 구석에 어디 브랜드라도 좋으니 소화기 하나쯤은 두고 살자.. 어차피 대업 이룰 것도 없는데 다 함께 가늘고 길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보아요.
세이프라이프 브랜드의 흰색 소화기는 예쁘기도 하니까 추천.
이렇게 뮤지컬 감상글을 소화기 영업글로 끝내면 이상하니까 다시 뮤지컬 타이타닉 얘기로 문을 닫자면...
이거 만든 제작사인 오디의 예전에 망했던 뮤지컬 '닥터지바고'를 좋아했던 관객이라면 아마 이 '타이타닉'의 밋밋함과 장황함도 마음에 들 거다. 내가 그렇다.
아무래도 난 그냥 오디의 가장 오디스러운, 밋밋한데 자기가 자기에게 취한 듯한 감성을 좋아하는 것 같다.